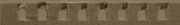영국인들은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인도 전체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예술의 본고장 ‘파리’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꼭 한곳을 꼽으라면 반 고흐, 르누아르, 고갱, 세잔 등 전 세계가 열광하는 미술가의 걸작을 보유한 오르세미술관일 것이다. 프랑스가 매년 전 세계에서 82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제1의 관광대국’으로 군림하는 것도 오르세미술관 같은 ‘막강 예술콘텐츠’를 즐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뮤지엄인 파리, 오르세는 ‘가장 아름다운 꽃’=행정구역상 20개 구(區)로 이뤄진 프랑스 파리는 한마디로 ‘스토리 박물관’이다. 도시 전체가 뮤지엄이요, 역사교육장이다. 세계인들이 ‘예술의 도시’라 부르는 파리를 프랑스인들은 ‘빛의 도시’라 부른다.

파리는 몹시 좁은 편이다. 도시를 둘러싼 36㎞의 환상도로(옛 성벽) 안쪽이 1860년 이래 파리의 핵심 시가지다. 인구 약 220만명의 파리를 찾는 관광객은 그러나 연간 3400만명을 웃돈다.
관광객이 파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루브르박물관(연간 약 850만명 관람), 에펠탑(약 700만명), 퐁피두센터(약 600만명), 개선문, 로댕박물관, 몽마르트르 언덕 등 가슴을 설레게 하는 문화유산들 때문이다.
특히 센강의 남쪽 ‘좌안(左岸:리브고슈)’에 위치한 오르세미술관(Musee d’Orsay)은 파리의 수많은 뮤지엄 가운데 ‘얼굴’에 해당된다.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을 비롯해 19세기 인상파 작품으로 유명한 이 미술관은 원래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를 위해 설계된 기차역이었다. 오를레앙 철도회사는 도심인 오르세에 대규모의 역을 건립했다. 오르세 역은 파리 시 외곽의 오스테를리츠 역과 함께 파리철도의 중추였다. 건축가 빅토르 랄루(파리국립건축학교 교수)는 탄탄한 철골과 미려한 석조로 ‘장중함’과 ‘예술성’을 동시에 낚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랄루의 기념비적 역작인 오르세 역은 전성기가 그리 길지 못했다. 철도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어졌던 것. 1939년 폐쇄된 오르세 역은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포로수용소로 잠시 쓰였고, 1962년에는 오손 웰즈의 영화 ‘심판’의 촬영장으로 쓰인 후 오랫동안 쓸모없는 공간으로 방치됐다. 그러다 1979년 파리 시 전체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현대화 작업이 시행되며 재정비 대상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덩치만 크지 별 쓸모없는 철도역을 빨리 철거해 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초대형 호텔을 짓자’는 방안도 나왔다. 이때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오르세 역을 구해낸 것은 강 건너의 루브르였다. 루브르박물관은 “19세기 후반의 미술품을 따로 모아 전시할 공간이 꼭 필요하다”며 오르세 역의 재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로선 더없이 신선하고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이 방안이 채택되면서 오르세 역은 1986년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버려진 기차역의 놀라운 변신, 오르세=1970년대 중반 조르주 퐁피두 정부를 필두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오르세 역을 ‘인상파 미술을 담는 미술관’으로 멋지게 마무리했다.

리노베이션을 진두지휘한 건축가는 가에 아울렌티. 아울렌티는 중앙홀을 차지하던 철로와 육교, 플랫폼을 철거해 궁륭을 넓혔다. 또 철로가 있던 양쪽에는 테라스를 설치해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물론 대선배였던 랄루(건축가)가 만든 서까래, 석고조형물 등은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고색창연한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한 것.
이로써 무수히 많은 여행객과 파리지엔들이 오가며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냈던 철도역사는 오늘날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품으면서 ‘또 다른 스토리의 보고’로 태어났다.
오르세미술관은 밀레의 ‘이삭줍기’와 ‘만종’, 마네의 ‘올랭피아’ ‘풀밭 위의 점심’, 로댕의 ‘지옥의 문’, 반 고흐의 ‘화가의 방’, 드가의 ‘발레교습소’, 고갱의 ‘타이티의 여인들’ 등 전 세계 미술교과서에 실려 있는 최고 걸작을 내걸어 해마다 약 700만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특히 오르세는 루브르에 비해 관람객의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다. ‘가장 매력적이고 친근한 19세기 인상파 미술’과 근대미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르세미술관은 국내에서 멋진 광고CF로 패러디되기도 했다. 버려진 역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대자동차그룹 건설사인 엠코의 광고는 ‘이달의 좋은 광고’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실 오르세처럼 기존의 건물을 부수지 않고, 새롭게 재활용하는 사례가 유럽에선 부지기수다. 이탈리아가 그렇고, 독일이 그렇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의 옛 함부르크 역을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함부르크반호프미술관으로 변신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세기 중반 후기고전양식으로 지어진 함부르크 역은 1906년 미술관으로 전용됐으나,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버려졌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96년 근대적 미술관 건물로 리노베이션해 ‘독일현대미술의 대표적 명소’로 변모시켰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경우는 낡은 군수공장(아르세날)을 거의 그대로 살려 베니스엔날레 특별전시관으로 보란 듯이 활용하고 있다. 오히려 매끈한 현대공간보다 이 낡은 공간을 작가들은 더욱 선호하고 있어 이채롭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도 따산츠798지역의 낡은 군수공장이 현대미술가들의 다양한 작업을 담는 첨단공간으로 십분활용돼 ‘베이징 최고의 문화밸리’도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기차역사라든가 공장, 창고, 조선소 등이 문화공간으로 자주 재활용되는 이유는 천장이 높아 공간이 시원스레 트여 있는 데다, 그 공간만이 지닌 독특한 아우라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유구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등지의 국가들은 오래된 건물과 그 장소가 지닌 ‘스토리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낡은 공간의 재활용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건물이 20~30년만 넘어도 미련없이 부숴버리는 우리로서는 못내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무수히 많은 이들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 ‘최고의 스토리 집합소’로 통하는 기차역을 최고의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파리 오르세미술관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고려해봄 직한 사례다. 시대와 역사를 통과해온 스토리는 이렇듯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현대의 또 다른 동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 출처 : 헤럴드 생생뉴스(heraldbiz.com) -